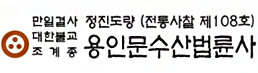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우림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15 01:20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밍키넷: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매력과 활용법
밍키넷이란 무엇인가?
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밍키넷을 활용하는 방법
밍키넷의 장단점 분석
밍키넷의 미래 전망
밍키넷이란 무엇인가?
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밍키넷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성 보장: 사용자들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IT, 게임, 생활, 취미 등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밍키넷을 활용하는 방법
밍키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의 게시판 찾기: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게시판을 찾아 활동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규칙 준수: 밍키넷의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사용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밍키넷의 장단점 분석
장점: 익명성 보장,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실시간 채팅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단점: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일부 게시판의 관리 미흡 등이 있습니다.
밍키넷의 미래 전망
키워드: 밍키넷,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성, 게시판, 실시간 채팅, 밍키넷 새주소, 2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시사IN 박미소
장관께서는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대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자를 보호 객체에서 예방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놀랍고 반가운 발언이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 연구, 소송을 해왔던 저와 제 동지들의 오랜 생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장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그 위험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한국전자인증 주식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권리의 핵심은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알 권리’의 현실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알 권리가 모든 권리의 시작점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험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차이나하오란 주식
하지만 그 현실은 암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제5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허울뿐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업미국주식사는법
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란 무엇일까요. 산안법에 명시된 자료들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제42조 이하), 안전보건진단 결과(제47조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제110조 이하), 작업환경측정 결과(제125조 이하)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문서들의 열람을 시도하다 여러 번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모바일황금성
조차 이 문서들의 보관처와 관리 책임을 물으면 우왕좌왕합니다. 법원이 관련 문서의 제출을 명하자,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청에, 지청은 다시 안전보건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현실
야마토동영상
정보접근권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안전보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선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산재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자료 요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비밀’입니다. 사측이 그 네 글자를 앞세우기만 하면, 고용노동부 측은 별 고민 없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조차 효능이 사라집니다.
2017년과 2018년, 시민단체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대한 ‘영업비밀’ 주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국회가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4),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일부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과오를 깨닫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그 후로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은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총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시사IN 이명익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 노동자, 활동가, 연구자들은 그러한 권리들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왔지만,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만 되었다가 사라진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관련 경험과 고민, 구상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현장 활동가(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자 권리 TF’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제언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벗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임자운 (변호사) editor@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관께서는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대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자를 보호 객체에서 예방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놀랍고 반가운 발언이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 연구, 소송을 해왔던 저와 제 동지들의 오랜 생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장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그 위험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한국전자인증 주식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권리의 핵심은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알 권리’의 현실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알 권리가 모든 권리의 시작점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험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차이나하오란 주식
하지만 그 현실은 암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제5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허울뿐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업미국주식사는법
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란 무엇일까요. 산안법에 명시된 자료들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제42조 이하), 안전보건진단 결과(제47조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제110조 이하), 작업환경측정 결과(제125조 이하)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문서들의 열람을 시도하다 여러 번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모바일황금성
조차 이 문서들의 보관처와 관리 책임을 물으면 우왕좌왕합니다. 법원이 관련 문서의 제출을 명하자,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청에, 지청은 다시 안전보건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현실
야마토동영상
정보접근권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안전보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선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산재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자료 요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비밀’입니다. 사측이 그 네 글자를 앞세우기만 하면, 고용노동부 측은 별 고민 없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조차 효능이 사라집니다.
2017년과 2018년, 시민단체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대한 ‘영업비밀’ 주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국회가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4),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일부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과오를 깨닫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그 후로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은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총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시사IN 이명익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 노동자, 활동가, 연구자들은 그러한 권리들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왔지만,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만 되었다가 사라진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관련 경험과 고민, 구상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현장 활동가(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자 권리 TF’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제언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벗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임자운 (변호사) editor@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